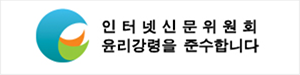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시절부터 오너 일가를 보좌하며 참모로 활약해온 김걸 전 사장에 이어 최근 최측근이었던 김우주 전무까지 그룹을 떠난데 이어 첨단기술을 책임지고 있었던 송창현 AVP(첨단차플랫폼) 본부장도 사의를 표했다.
현대차그룹에서 경영과 기술분야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떠나는 건 이례적인 경우로 정 회장이 그만큼 조직장악과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방증이다.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정리되는 사이에 정 회장의 오른팔인 장재훈 부회장이 그룹 컨트롤타워로 입지를 굳히면서 'ES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 대표도 맡고 있었던 송창현 본부장은 3일 포티투닷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의선) 회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현대차그룹 AVP 본부장과 포티투닷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송 사장은 “거대한 하드웨어 중심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DNA를 심고 차가 아닌 AI 디바이스를 만들겠다는 무모한 도전이 쉽지 않고 순탄치 않았다”며 “테크 스타트업과 레거시 산업 사이에서 수 없이 충돌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안팎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송 사장 사퇴의 변(辨)과 사뭇 다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책임지는 차원에서 송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그간 AVP 본부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나 경쟁사들에 비해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자율주행 선두 주자인 테슬라는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인 '감독형 FSD'를 국내 도입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혼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차에 탑재한 데 반해 기술 적용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내년 중순까지 SDV 페이스카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리더십 교체가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송 사장이 물러나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CES 2026에서는 SDV 관련 발표가 빠진 것으로 안다"며 "최근 R&D본부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곧 있을 그룹 인사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차 수뇌부가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송 사장의 방식에서 벗어나, 엔비디아와의 협업 같은 외부 기술 활용으로 전략을 전환하려 한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메리츠증권은 송 사장의 퇴진을 두고 "현대차그룹의 독자적인 스마트카 개발을 이끌어왔던 송 사장의 퇴진은 자체 기술 도전보다 엔비디아와의 협업에 집중하자는 수뇌부의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더 빠르게 테슬라와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정 회장은 이에 앞서 경영 참모진 인적 개편도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몽구 명예회장 시절 측근들이 대거 물러났다.
기아차로 옮긴지 11개월만에 퇴진한 김우주 전무
김우주 전무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기아 오너십관리사업부장직을 내려놓고 퇴임했는데 이는 지난 해 현대차에서 기아로 소속을 바꾸며 해당 직책을 맡게 된 지 11개월 말이다. 현대차에서 ‘전략기획통’으로 불리우던 김 전무가 기아차로 옮길 당시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돌았는데 결국 퇴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몽구 명예회장 시절부터 14년간 기획조정실에 있던 김걸 전 사장도 최근 정몽구재단 부이사장으로 옮겼다.
현대차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여전히 분명하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벗어나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아우르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대 미흡에 대한 책임 문제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술 조직과 경영 참모 라인의 동시적 재편은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