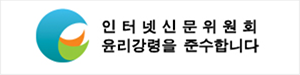이러한 상속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단연코 특별수익이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 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특별수익이란 부동산, 현금, 주식 등 피상속인 에게 받은 재산을 통칭한다. 그렇다고 하여 피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피상속인이 상속인 A가 결혼할 때 신혼집 구매비용으로 1억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으로 볼 것이지만 사소하게 아기 옷이나 용품 등을 사라고 20만 원을 증여하였다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이에 관해 신동호변호사는 100만 원 이상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상속사건에서 상속재산이 5억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수십 억, 수 백 억이라면 1,000만 원 정도의 증여액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 둘 필요는 있다.
한편, 최근 실무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특별수익의 입증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법원에서 점점 더 까다롭게 증거조사를 심리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증거조사의 회신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내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사실조회를 통해 쉽게 밝힐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을 거부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나 시·군·구청의 사실조회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내역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재산이나 현금의 경우에도 같은 어려움이 있다. 금융재산은 재산조회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거래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거래내역 일체를 받아 보아야 한다. 해당 재산조회는 피상속인 사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데, 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면 결국 몇 개의 은행을 찍어서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렇게 일부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일일이 상속인들이나 다른 피상속인의 계좌와 거래된 내역이 있는지 살펴 추적해 들어가야 하며, 이는 매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
이처럼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입증해내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정인 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즉, 개인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법인에서는 그만의 노하우와 비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후회 없이 유류분반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을 찾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보기를 권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