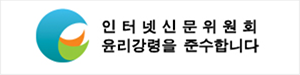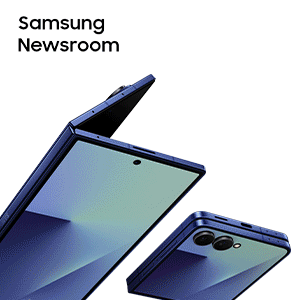김한샘 알케미랩 대표이사.
그런데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였다. 미국에선 보통 준도매급 매장에서 콜라를 궤짝으로 사다 놓는다. 이렇게 우리 집 콜라 공급량은 수십배로 뛰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콜라를 마셔야겠다는 충동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 많은 콜라에는 몇 주째 먼지만 쌓여 가고 있었다.
경제학은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시장에서 가격이 더 크게 출렁인다고 말한다. 부동산이 딱 그렇다. 수요가 많아졌다고 부동산이라는 위치 좌표를 하나 더 만들 수는 없다. 길을 넓히고 지하철을 깔아도, 그 입지의 “땅” 자체는 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만 불어도 가격이 먼저 튀고, 서로 잡겠다고 경쟁이 붙는다. 경쟁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결국 우리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비슷한 문제를 고민했던 경제학자가 있다. “왜 기술은 발전하고, 자본은 축적되는데, 빈곤은 사라지지 않을까?” 19세기 샌프란시스코의 신문기자 헨리 조지는 이 질문을 붙잡았다. 그는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을 내고, 사회가 함께 만든 토지가치 상승분—지하철역, 학교, 공원 같은 게 만든 프리미엄—을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줄로 압축하면 이거다. 땅값이 오른 건 개인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왜 하필 보유세일까. 세금이 나쁜 건 보통 사람들이 “피할” 수 있을 때다. 소득세율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은 일을 줄일 것이고, 투자세율이 너무 높으면 투자 의사결정을 미룬다. 그런데 땅은 줄일 수도, 해외로 옮길 수도 없다. 공급이 거의 고정된 대상에 매기는 세금은 생산성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게다가 토지가치에만 매기면, 빈집을 오래 붙들 동기가 약해진다. 시장이 숨을 쉬려면 거래가 돌아야 한다. 거래가 돌려면 매물이 나와야 한다. 매물이 나오려면 보유의 유인이 낮아져야 한다. 순서가 이렇다.
지금 한국은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모습이다. 임기 초 약속 때문에 보유세는 사실상 못 건드린 채, 과열이 보이면 대출 규제를 더 죄는 방식이 반복된다. 한편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돈이 풀리며 가계 쪽 유동성은 늘었다. 공급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주택시장에서는 이런 엇박자가 가격 풍선효과로 나타나기 쉽다. 콜라 한 병을 두고 10초 싸움하던 어린 나처럼, 병목이 풀리지 않으면 싸움은 가격으로만 터진다.
처방은 어렵지 않다. 보유의 유인을 바꾸면 된다. 땅에는 무겁게, 건물에는 가볍게. 토지가치 중심의 보유세를 “충분히 높게” 올려서,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돌릴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금흐름이 약한 1가구 1주택 고령층에겐 유예·이연 같은 장치를 두면 된다. 다주택, 유휴지는 예외 없이 적용하면 된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면 매물이 나오고, 이동성이 살아난다. 제도가 신호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가격은 자기 자리를 찾는다.
보유세를 올려라. 망설이지 말고, 충분히.
[김한샘 알케미랩 대표이사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