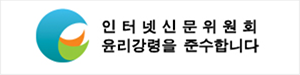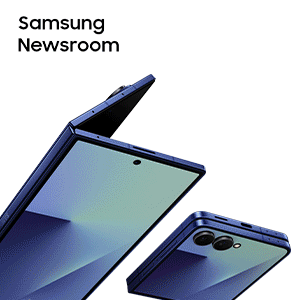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김병철 칼럼⑭] “TDF 분산투자? 퇴직연금에선 독이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206094455075145ebfd494dd112222163195.jpg&nmt=29)
2025년 말, 미국 실리콘밸리의 ‘존(John)’과 한국의 ‘김 부장’의 계좌를 다시 들여다보자.
존의 401(k) 계좌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상품, ‘뱅가드 TDF(Vanguard TDF_CIT 구조)’만이 담겨 있다. 반면 한국의 김 부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운용사의 TDF와 정기예금을 나눠 담고 있다. 김 부장이 선택한 디폴트옵션은 “성과가 좋은 두 운용사의 TDF를 1차로 선택하고, 안정성을 위해 예금도 함께 담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표면적으로는 ‘분산 투자’처럼 보이지만, 퇴직연금의 본질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오해다.
미국의 존은 단일 TDF에 자산을 집중함으로써 거대 자본이 누리는 ‘도매가 수수료’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반면, 김 부장은 자산을 쪼개느라 규모의 경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그 결과 김 부장은 더 높은 보수뿐 아니라, TDF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간접비용까지 포함해 자신의 노후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
미국 수탁자를 움직이는 힘, “비용 절감은 곧 수익이다”
미국 기업들이 가입자를 위해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데 사활을 거는 이유는 ERISA법(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이 규정한 강력한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때문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 연방대법원의 ‘티블 대 에디슨(Tibble v. Edison International)’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수탁자가 단순히 상품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저렴한 기관용 상품이 있음에도 비싼 소매용 상품을 방치한 것은 위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수탁자들은 앞다퉈 일반 뮤추얼펀드에서 CIT(Collective Investment Trust, 집합투자기구)로 갈아탔다. CIT는 브로커 판매와 마케팅 비용이 배제된 기관 전용 상품으로,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표준이 됐다. 미국 수탁자들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단 하나의 우수한 CIT 상품에 집중시켜 운용사로부터 가장 낮은 수수료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한국의 역설, 형식은 갖췄으나 ‘협상력’을 잃었다
우리나라도 TDF를 사실상 CIT에 준해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전용 클래스(C-P 등)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 제도의 하드웨어는 상당 부분 갖춘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운용의 소프트웨어, 즉 ‘거버넌스의 작동 방식’에 있다.
물론 이 지점에서 “DB형(확정급여형)에도 적립금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지 않으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실패라기보다, 거버넌스가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로 봐야 한다.
진정한 거버넌스의 힘은 흩어진 개인의 자금을 하나로 뭉쳐 금융기관과 수수료 협상을 벌이는 데서 나온다.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거버넌스가 있어도 이 ‘공동 구매’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가입자들은 여전히 ‘도매가’가 아닌 비싼 ‘소매가’로 상품을 각자 구매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굳이 가격을 낮춰줄 유인을 느끼지 못한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백화점식 상품 나열’이 계속되는 한, 자산은 파편화되고 규모의 경제는 요원하다.
한국의 김 부장은 ‘분산 투자’라는 명분 아래, 기관 투자자로서 누려야 할 비용 우위와 협상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왜 TDF는 ‘단일 처방’이어야 하는가
TDF는 그 자체로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 자산배분 솔루션’이다. 종합 비타민 한 알에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들어 있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로 여러 종류의 종합 비타민을 섞어 먹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미국의 디폴트옵션(QDIA)이 단일 TDF를 표준으로 채택한 이유는 단순하다. 전문가(거버넌스)가 책임지고 가장 우수한 운용사 하나를 선정해 자산을 몰아줌으로써,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입자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TDF를 여러 개 섞는 문화는 전문가가 책임지고 ‘하나’를 고르지 못하는 거버넌스 부재의 산물이다. 계약형 구조 아래에서 조타수 역할을 맡길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여러 조타수에게 방향타를 나눠 쥐여주고 가입자에게 최종 항로 선택을 떠넘긴 결과다. 그 사이 가입자의 노후 자금은 중복 비용과 규모의 경제 상실이라는 암초로 향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복원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필자는 1,500조 원 연금 강국으로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환을 제안한다.
첫째, 수탁자(기업 위원회)에게 ‘비용 최소화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상품을 몇 개 올려두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집중시켜 가입자의 총비용을 낮췄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나열식 판매 관행을 넘어 ‘단일 TDF 처방’을 원칙으로 하는 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소액 투자가 아니라, 수백만 근로자의 자본이 모인 거대 자본이다. 이 자본을 하나로 묶어 운용사와 가격 협상을 벌이는 것이 거버넌스의 본령이다.
책임 있는 집중, 그리고 가입자의 최종 선택권
거버넌스는 상품을 진열하는 가판대가 아니다. 수많은 가입자를 대신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값에 공동 구매해오는 강력한 대리인이어야 한다.
다만, 이 ‘집중’은 강제가 아니다. 전문가가 책임지고 단일 TDF를 디폴트로 제시하되, 가입자는 언제든지 이를 명확하게 거부(Opt-out)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도매가로 가져올 책임을 지고, 가입자는 그 책임 있는 판단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수탁자들이 단일 CIT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이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정직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방치된 분산’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집중’과 명확한 거부권이 공존하는 디폴트옵션으로 진화해야 한다. 규모는 곧 수익률이며, 그 규모를 만드는 힘은 결국 작동하는 거버넌스에서 나온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