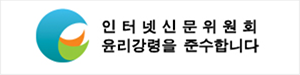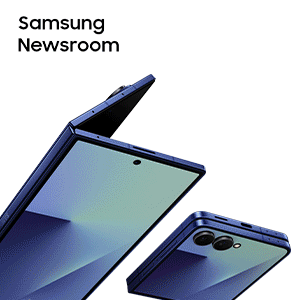나자현 변호사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소주 반잔 정도의 음주만으로도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 음주 단속의 잣대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고, 운전 행위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 즉, 차량에 앉아 시동만 켠 상태로는 운전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실제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의도가 없고 단순히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면 운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며, 최근 법원은 재범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건의 구체적 사정, 즉 운전 경위, 음주량, 운행 거리, 자진 신고 여부 등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핵심 논점 중 하나는 운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정확했는지 여부이다. 측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음주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했다면 실제 농도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의자는 측정 시점과 음주 종료 시점을 근거로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다. 또한 대리운전을 부른 뒤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단속에 걸린 사례처럼 운전 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고려 대상이 된다. 법원은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거나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않고, 차량 조작과 이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의 적법성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측정기기의 교정 주기, 절차 준수 여부, 경찰 요구에 응한 시기 등은 법적 요건에 포함되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더불어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불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측정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측정을 받고 그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음주 측정의 정확성, 단속 절차의 적법성, 운전 여부, 재범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검토가 필수적이며,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속 현장에서 당황해 부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