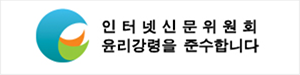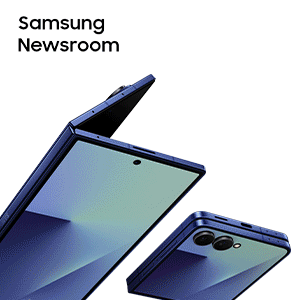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구조를 갖춘 범죄 형태다.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대포통장 제공자, 콜센터 상담자, 현금 수거책, 중계기 설치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몰랐다’, ‘그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공문서 위조죄(형법 제225조) 등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단순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통장, 카드, 계좌 등)를 대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위조 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까지 추가되어 형이 더욱 무거워진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직에 이용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 ‘단순 심부름’, ‘대가 없이 맡은 일’이라는 항변은 충분한 방어 논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경우라 해도, 수사기관은 실제 정황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따지게 된다”며 “중요한 것은 명확한 해명이 아닌 이상,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결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인출책이나 수거책 같은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만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