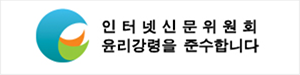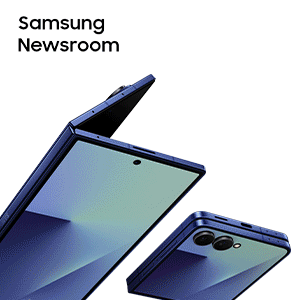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지난 1편에서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급여 안전 보장'이라는 일차적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평가했다. 하지만 2편에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진정한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퇴직연금이 '최후의 보루'인 목돈으로 전락해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이를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현실도 살펴봤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근로자들은 목돈 인출을 선택할까? 단순히 개인의 의식 문제만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가 태생적으로 '퇴직급여 보호'에만 머물렀던 초기 목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의 조각화, 낮은 수익률로 인한 기대감 부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근로자의 연금 수령 의지를 꺾고 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자산 증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노후를 위한 '장기 자금'이라는 제도적 목표와 달리, 근로자들이 제도를 '언제 인출할지 모르는 목돈으로 잠시 맡겨두는 단기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박 대리의 사례를 보자. 그는 3년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노후 준비는 멀게 느껴져 계좌를 사실상 방치했다.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로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했다. 3년 후 이직하면서 계좌를 정산해 보니 수익률은 고작 연 2.5% 남짓이었다. 같은 기간 박 대리의 임금은 매년 5% 이상 인상됐지만, 퇴직급여는 약 900만원에 불과했다. "3년 동안 넣었더니 물가 상승률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 돈을 결혼 자금에 보태기 위해 일시금으로 인출했다.
무관심과 함께 목돈이라도 지키려 한 선택은, 결국 낮은 수익률로 돌아와 노후 급여의 가치를 훼손하고 근로자가 더욱 제도를 불신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다.
조각난 퇴직금, '연금 통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한국 직장인들은 잦은 이직을 경험하며, 이때마다 퇴직급여가 조각조각 분산된다. 조각조각 분산된 금액으로는 노후에 매달 받게 될 연금액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직 시 퇴직금을 한데 모아 연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노력을 제도 자체가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러 번의 이직에도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연금'으로 만들려는 근로자의 노력은 제도적 미비로 인한 행정적 문제 앞에 가로막혀 있다. 결국 대출 상환 압박에 직면한 최 과장은 "어차피 연금으로 통합이 어렵다면" 대출금을 갚기로 결정했다. 근로자가 성실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통합을 지원하지 못하는 제도적 구조가 결국 목돈 인출을 유도하는 셈이다.
연금을 원해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평생 연금 상품의 부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로자가 연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연금 수령을 원했을 때조차 이를 보장해 줄 만한 제대로 된 상품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우 부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을 했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그는 은퇴교육을 통해 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퇴직급여를 평생 지급되는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평생을 책임져줄 퇴직연금 상품을 찾던 우 부장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 하에서는 아직 연금 수령 단계에 맞는 상품군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연금 지급을 의무화하거나 유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장수 리스크를 완벽하게 헤지(Hedge)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종신 연금 상품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우 부장은 평생 연금 대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리한 10년 분할 지급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나눠 받는 '변형된 목돈 인출'에 불과하며, 장수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연금의 필요성을 깨달은 우수 근로자조차도, 제도와 시스템의 미완성 때문에 연금을 포기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돈을 지키는' 금고를 넘어 '노후를 지키는' 안전망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낮은 효율성은 단순히 개인의 의식 문제가 아니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에서 출발한 구조적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어차피 제도가 연금을 보장해 주지 못할 바엔, 목돈이라도 받아 내가 쓰는 게 낫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는 IMF의 비극을 막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다. 이제는 '노후를 지키는' 진정한 안전망으로 진화해야 할 두 번째 큰 질문에 직면했다. 다음 4편에서는 이 악순환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인 '선택의 함정'에 대해 파헤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권한과 정책적 해법이 필요한지 논의하겠다.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