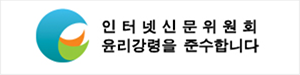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지난 1부에서 우리는 IMF 외환위기라는 트라우마 속에서 탄생한 한국 퇴직연금이 '안전한 보관'에는 성공했으나, '자산 증식'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혁신(Revolution)이다. 하지만 대다수 적립금이 머물러 있는 기존 계약형 제도도 방치할 수는 없다. 기금형 확대와 동시에 계약형 제도의 질적 진화(Evolution)가 병행되어야 한다.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 미국 퇴직연금 시장은 단순히 주식이 올라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40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 놓인 5명의 미국 노동자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한국 퇴직연금이 가야 할 이정표를 찾아보려 한다.
첫번째 사례는 정통 DB형의 수혜자 ‘톰(Tom)’이다.
70대 은퇴자인 톰은 과거 제너럴모터스(GM)에서 35년을 일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매달 회사가 보내주는 두툼한 연금 수표를 받는다. 재직 시절 연금 운용 책임과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약속된 금액(Defined Benefit)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이는 퇴직할 때까지만 책임지는 한국 기업과는 다른 축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DB제도 또한 기업의 위험부담이 부각되며 점차 사라지고 있다.
두번째 사례는 대기업 직원 ‘스미스(Smith)’다.
톰의 시대가 저물고 DC(확정기여)형 시대가 도래했다. 구글에 입사한 스미스 씨는 회사가 사망할 때까지 책임져 주지 않지만, 은퇴할 때까지 철저히 보호한다. 입사 첫날, 그는 회사가 엄선한 5개의 투자 상품 리스트를 받았다. 한국의 김 부장이 수백 개의 상품 목록 앞에서 길을 잃는 것과 대조적이다. 회사가 법적인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을 지는 '플랜 스폰서(Plan Sponsor)'로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상품을 사전에 배제한다. 스미스 씨는 자신의 은퇴 시점에 맞는 TDF(타깃데이트펀드) 하나를 골랐고, 지금까지 연평균 8% 수준의 높은 성과를 누리고 있다.
세번째는 중소기업에 다닌 ‘존(John)’의 사례다.
존은 금융에 무관심하고 게으르다. 한국이었다면 "귀찮으니 안전한 은행 예금에나 넣자"라며 퇴직연금을 방치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시스템은 존의 게으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미국의 자동가입제도(Automatic Enrollment)는 존의 연금을 적격디폴트옵션(QDIA)인 TDF에 자동으로 투자하여 그를 높은 수익률의 길로 이끌었다. 한국의 디폴트옵션이 여전히 가입자에게 복잡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선택하지 않는 게으름조차 성공적인 투자로 연결한다.
다음은 미용실 직원이었던 ‘메리(Merry)’다.
직원이 3명뿐인 미용실에서 일하는 메리. 과거라면 퇴직연금은커녕 퇴직금 받기도 힘들었을 환경이다. 하지만 그는 'PEP(Pooled Employer Plan)'라는 제도를 통해 대기업 수준의 연금 혜택을 받는다. 수천 개의 영세 사업장이 하나의 거대한 퇴직연금 플랜으로 뭉치자(Pooling), 월가 최고 운용사에게 낮은 수수료로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와 상당부분 유사한 모델이다. 메리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지만, 그의 노후 자금은 거대한 규모의 경제 속에서 안전하게 굴러간다.
마지막으로 은퇴자 ‘알프레드(Alfred)’의 사례다.
은퇴 생활을 즐기는 알프레드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10명 중 9명이 목돈으로 찾아 쓰지만, 알프레드는 401k 계좌를 유지하며 매년 전체 자산의 4% 내외를 생활비로 인출한다. 나머지 잔액은 계속 시장에 투자되어 높은 수익을 낸다. 그는 평생 이 계좌를 유지하며 '셀프 연금'을 누리다, 남은 돈은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다.
우리가 놓친 것, 하드웨어만 가져온 20년의 과오
이 5명의 사례는 미국 퇴직연금 제도가 걸어온 피나는 진화의 역사다. 미국 역시 DC제도인 401(k)를 도입할 당시에는 지금의 한국처럼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엔론 사태 등으로 근로자들이 노후 자금을 날리는 고통을 겪은 후, 그들은 2006년 연금보호법(PPA) 등을 통해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개인에게 선택을 맡기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401k 안에 ▲수탁자 책임(스미스), ▲자동운용 시스템(존), ▲집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메리)라는 안전장치를 심어 넣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05년 제도 도입 당시, 우리는 미국의 하드웨어인 ‘DB/DC/IRA’라는 틀은 가져왔지만, 이를 구동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과 거버넌스’는 빠뜨린 채 도입했다. 더 뼈아픈 것은 제도 도입 이후 미국이 PPA법과 시큐어법(SECURE Act)을 통해 끊임없이 제도를 진화시키는 동안, 우리는 근본 구조는 여전히 초기 계약형 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한국의 김 부장과 이 대리는 수탁자 책임이 부재한 시장에서 전문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수많은 상품 리스트 앞에서 각자도생하거나 방치되고 있다.
계약형 제도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부에서 주장한 기금형 확대는 시간의 문제일 뿐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법이 바뀌고 제도가 정착되는 동안에도, 당장 500조 원 규모의 계약형 제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2부에서는 톰의 행운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한국의 김 부장을 스미스와 존처럼 시스템으로 보호받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 ▲계약형 구조 아래서도 회사와 금융기관에 어떻게 수탁자 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무늬만 디폴트옵션인 한국 제도를 미국의 QDIA처럼 강력한 자동 운용 도구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IRP가 단순한 세제 혜택 통장을 넘어 미국의 IRA처럼 평생 소득 계좌로 진화하는 길 등을 하나씩 짚어볼 것이다.
연금 선진국인 미국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의 터널을 지나왔다. 그들이 찾은 출구는 '방치된 자유'가 아닌 '설계된 보호'다. 늦었지만 우리도 계약형 제도 안에 '전문가'와 '책임'을 심어 넣어야 한다. 기금형이라는 새로운 엔진과 함께, 진화된 계약형이라는 날개를 달고 1,500조 연금 강국으로 비상하는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