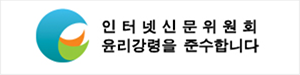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브릿지바이오는 최근 한 투자사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기존 최대주주 지분을 직접 매각하지는 않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구조로 자금을 수혈하는 방식이다. 신주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입시켜 자본을 늘려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다.
이는 브릿지바이오가 지난 3월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과 직결된다.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이 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에 이어 1년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연내 7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400억원대인 회사 시가총액과 이정규 대표의 지분율(8.33%)을 감안할 때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피한 규모다. 이 대표는 "경영권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브릿지바이오의 위기는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의 연이은 임상 실패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타격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의 실패였다. 브릿지바이오는 2019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이 약물을 최대 1조50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했지만, 2020년 독성 우려로 권리를 되돌려받았다.
이후 자체 임상을 진행했으나 지난달 14일 임상 2상에서 투약군이 위약군보다 뒤떨어진 효능을 보였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3년 2월에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BBT-401도 글로벌 임상 2a상에서 투약군이 위약군보다 치료 효과가 더 낮게 나타나며 실패했다.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1만원을 넘보던 브릿지바이오의 주가는 임상 실패 공시 이후 700원대 수준으로 추락했다. 회사는 최근 내부 인력을 36명에서 10명 안팎으로 줄이며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업계에서는 법차손 규제가 신약 개발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약 개발은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고위험 사업이다. 임상 시험은 성공 확률이 낮고, 실패할 경우 그동안의 투자가 모두 손실로 이어진다. 이런 특성상 바이오기업들은 신약 출시 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브릿지바이오는 BBT-877, BBT-401 외에도 폐암 치료제 BBT-207,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301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K-바이오 열풍과 함께 제약·바이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릿지바이오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임상 시험 실패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다.
특히 바이오기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지출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차손 규제와 같은 상장 유지 요건도 추가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 주식에 투자할 때는 회사의 파이프라인 다양성, 재무 건전성, 임상 시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임상 실패 시 주가 급락과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