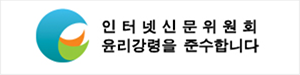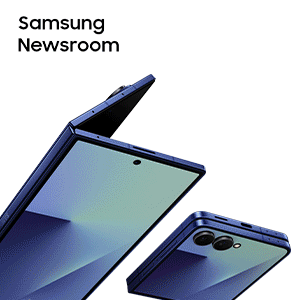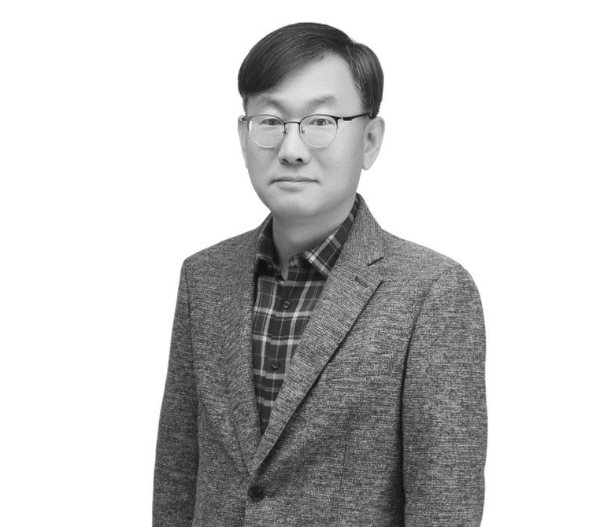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퇴직연금이 본래 목적인 노후 보장을 잃고 일회성 목돈으로 소진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진정한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할 퇴직연금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편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급여 안전 보장'이라는 일차적 목표는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퇴직연금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진정한 노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로 버텨야지' 하고 생각하는 '최후의 보루'인 목돈이다. 하지만 현실의 냉혹한 숫자들은 그 '최후의 보루'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소득 없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목돈은 이 긴 노후를 버티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다음의 예에서 퇴직연금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30년 근속 후 받은 퇴직금을 희망을 안고 창업에 올인한 최 부장. '최후의 보루'를 밑천 삼아 인생 2막을 시작했지만 창업의 길은 험난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퇴직금은 경기불황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두번째 실패 사례. 장 차장은 자녀가 결혼할 때 퇴직금을 받았다. "평생의 짐을 덜어주자"는 생각에 선뜻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목돈을 내어놓았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으나, 정작 본인의 은퇴 시점에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은 취약해졌다.
세번째 사례는 현실에 더 가깝다. 장 과장은 당장 눈앞의 빚이 더 급했다. 퇴직급여인 목돈은 주택 마련을 위해 사용했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였다. 잠시 안도했지만, 다가올 자신의 미래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
더한 경우는 막 회사를 그만둔 김 대리의 예. 그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지"라며 여행과 취미생활에 목돈을 소비했다.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미래에 큰 목돈이 될 노후 안전망의 씨앗을 미리 잃어버렸다.
이처럼 목돈인 퇴직연금은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작 노후 대비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다. 은퇴로 만지는 퇴직급여는 한 번의 이벤트에 불과하며, 장수라는 리스크 앞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목돈이 아니라 연금으로의 '퇴직연금'이다.
연금은 죽을 때까지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들어와 생활비를 책임진다. 7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매달 안정적인 노후 급여가 들어오며, 이러한 연금이야말로 불안한 노후를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부족함을 채워줄 3층 연금체계의 2층에 해당하는 핵심 안전망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지금까지처럼 목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넘어,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가 되어야 한다.
연금 수령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근로자들은 목돈 인출을 선택할까? 이 중요한 제도가 노후를 위한 '연금'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목돈'으로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식 문제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조각화되고, 낮은 수익률로 인해 기대감이 부족하며,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등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근로자들은 "어차피 제도가 연금을 보장해 주지 못할 바엔, 목돈이라도 받아 내가 쓰는 게 낫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 인식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의 낮은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이다.
다음 3편에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자세히 파헤쳐 본다. 왜 우리의 퇴직연금 제도가 태생적으로 '연금'이 되기를 포기했는지, 그 구조적 결함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