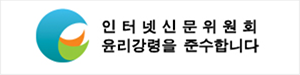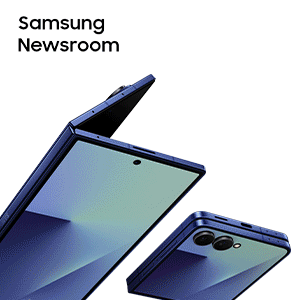김성일 이음연구소장(경영학박사).
600년 전 조선의 퇴직 보장 시스템
과전법은 조선 시대 관료들에게 일정한 농지를 제공하고, 그 농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현대의 연금이 은퇴 후 정기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과전법은 토지의 수확물을 통해 관료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연금을 받듯이, 조선의 관료들은 공직에서의 공헌을 바탕으로 토지 수조권을 받았던 것이다.
물론 두 제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대 연금이 화폐로 지급되는 반면, 과전법은 토지에서 나오는 곡물과 같은 자연산물로 소득을 보장했다. 이는 당시 조선이 철저한 농업 중심 사회였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근본적인 철학만큼은 600년의 시간을 넘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조선을 건국한 개혁 세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정도전은 과감하게 토지를 몰수해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계민수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급진적인 방안이었고,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조준이 제안한 과전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찾아낸 절충안이었던 셈이다.
과전법만의 독특한 특징들
과전법은 조선 초기 관료들에게 주로 경기 지역의 토지를 지급했다. 이전의 전시과와 가장 큰 차이점은 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 즉 은퇴한 관료들에게도 수조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현대 연금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과전법은 토지 분배를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고, 산림과 같은 부수적인 자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토지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였다. 수도 인근에 토지를 집중시킴으로써 관리와 감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과전법은 조선 초기 국가 운영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기득권 세력이 농지를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조선 중기 이후에는 직전법과 같은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어야 했다. 어떤 제도든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되고 진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조선의 과전법은 단순한 토지 분배 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려 했던 선구적인 시도였고, 사회적 안전망의 초기 형태였다. 현대 연금제도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갈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과전법은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