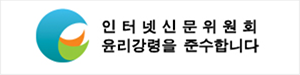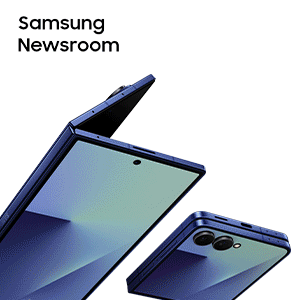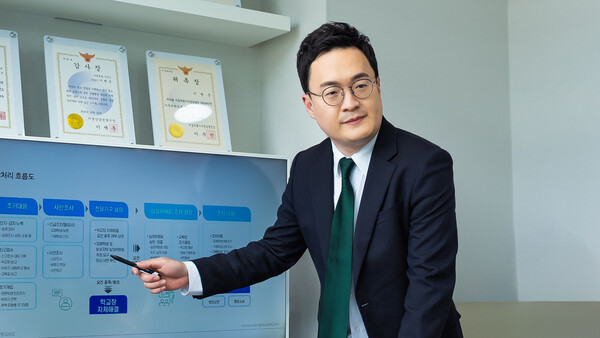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의사전달을 시도하는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흉기 소지 등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문제는 사건 초기에 명확한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민원·채권 문제, 직장 내 대화 요청 등 정당한 접촉을 시도한 행위조차 스토킹으로 오인되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방적인 진술이나 감정적 신고로 인해 사전 고지 없이 압수수색이나 긴급조치가 이뤄지면, 피의자는 방어 기회 없이 불리한 절차에 놓이게 된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시분리 조치와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통신 금지, 주거지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강제적 수단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과 해소되지 않은 분쟁이나 단절되지 않은 관계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 여부에 초점을 맞춰 처벌을 검토한다.
이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다", "감정이 격해져 연락했다"는 식의 대응보다는, 정당한 사유, 접촉의 경위, 연락 내용의 맥락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문자나 통화 기록, 주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와 동일 생활권에 있거나, 직장 또는 주거지가 겹치는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두기, 연락 중단 서약, 자발적 이사 등의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실질적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락에 응답했거나, 접촉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과실을 입증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