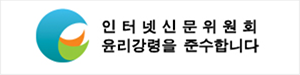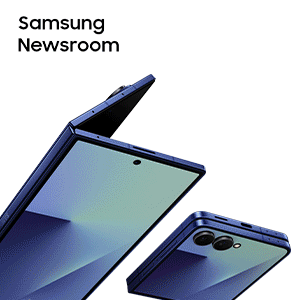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초가집의 이엉이 바람에 흔들리고, 굽이진 돌담길이 아늑하게 이어진다. 이곳의 풍경은 단순한 마을의 경관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생활의 지혜이자 공동체 정신의 결정체다.
볏짚으로 엮은 이엉은 혹독한 바람과 눈비에도 견딜 만큼 단단하고, 크고 작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담장은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왔다. 외암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겨울철 초가지붕을 다시 잇고, 무너진 돌담을 함께 고치며 삶과 전통을 잇는다.
▲무형유산 가치 검증…"기술적 탁월성·현장성" 주목
연구 결과, 외암마을의 초가이엉잇기는 충청도 전통 방식 그대로 서까래에 줄·연목을 설치해 연결하는 기법을 이어오고 있으며, 돌담쌓기 역시 제주 성읍마을과 함께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공동체 전승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기술적 탁월성과 현장성"을 지닌 외암마을 전통건축기술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민 중심 전승 체계'
현재 전국적으로 초가이엉잇기를 관리하는 마을은 93곳, 돌담쌓기는 67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민 보존회가 직접 나서 전승 체계를 유지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초가이엉잇기의 경우 외암마을을 포함해 단 5곳, 돌담쌓기는 외암마을과 제주 성읍마을 두 곳뿐이다.
즉, 외암마을은 위탁이나 외부 전문가 의존이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숨 쉬는 문화유산’으로 불린다. 초가집을 보유한 주민들은 서로 도우며 겨울철 이엉을 얹고, 마을 돌담이 무너지면 함께 돌을 모아 다시 쌓는다.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곧 전통기술 보존 체계가 된 셈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긴 볏짚이나 자연석 같은 재료 수급이 불안정하다. 연구진은 “계약재배와 품종 관리, 유통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안정적인 재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인 고령화로 기술 전승의 맥이 끊길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수 교육, 전수관 건립, 디지털 기록화 등을 통해 전승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용환 목원대 교수는 “외암마을 전통건축기술 전승 체계 구축과 재료·인력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기 교육과 워크숍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체험으로 전통을 일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린 세대가 전통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방안도 제시됐다. 실제로 외암마을에서는 초가이엉잇기 시연과 돌담쌓기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전통 건축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의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과 ‘생생 국가유산 사업’ 공모에 참여해 지원을 확보하고, 학술대회·전시·문화공연 등과 연계한 전승 활성화 로드맵도 마련됐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전승 모델
시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전문인력 운영 설계, 조례 정비, 재료 재배·유통 협력망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조성, 상설 시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 무형문화유산 지정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유산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성 아산시 문화유산과장은 "외암마을의 초가이엉잇기와 돌담쌓기는 지역 공동체의 삶을 이어온 생활 유산"이라며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전통기술 전승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