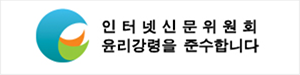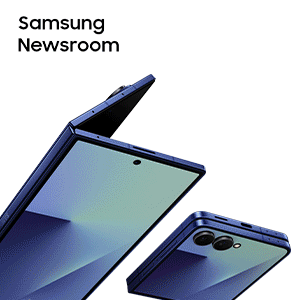김한샘 알케미랩 대표.
첫째 이유는 현실성이다. 연금은 학문이면서 산업이고, 동시에 정치다. 정부가 설계를 바꾸면 금융회사의 사업구조가 요동친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누적 수탁액은 약 400조 원. 쉽게 인출되지 않는 ‘갇힌 자금’이어서, 제도 변화 한 줄에 시장의 이해가 얽힌다. 그래서 현장에서 읽히는 보고서와 데이터, 정책 제안이 중요하고 경제학자의 언어가 필요하다. 디폴트 옵션과 자동가입·자동증액 같은 작은 설계가 참여율과 장기수익률을 좌우한다. 타깃데이트펀드, 생애주기형 포트폴리오, 수수료 상한선과 이해상충 관리까지, 제도는 행태를 만들고 행태는 성과를 만든다.
둘째 이유는 더 근본적이다. 연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제도다. 인간은 미래의 고통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다. 강제 저축이 아니면 노후 준비를 미루고, 과거처럼 중간정산이 쉬우면 각종 명분으로 인출한다. 그러나 초고속 고령화 속에서 노후 빈곤이 폭발하면, 이는 금융위기와 달리 단기간 유동성으로 덮을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 된다. 예컨대 같은 45세 직장인이라도, 은퇴 이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레버리지나 ‘묻지마 투자’에 덜 끌린다. 반대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조급함은 사기와 과열을 부른다.
나는 이것을 문화의 문제로 본다. 문화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규범이다. 미래 소득이 불확실하다고 느낄수록 사람은 나쁜 선택으로 몰린다. 데뷔까지 1년이 필요한 웹툰 지망생이 그 1년을 버티지 못해 평생 아르바이트에 묶이는 것, 은퇴 후 상권이 포화된 줄 알면서도 치킨집과 카페를 여는 것. 이런 역선택의 배경에는 “다음 달 현금흐름이 없다”는 공포가 있다.
연구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래서 명확하다. 좋은 상품을 고르는 요령을 넘어, 제도가 사람들의 선택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기본 설계—적립률, 수수료 체계, 디폴트 옵션, 인출 규칙—이 어떤 행동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지 데이터로 증명하고 싶다.
내 작은 꿈은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이다.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곱게 늙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그 품격을 지켜주는 것은 종교적 수련이 아니라, 노후에도 흐르는 현금이다. 연금은 노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더 용기 있게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문화의 인프라다.
[글로벌에픽 김한샘 알케미랩 대표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