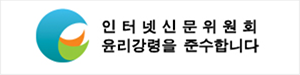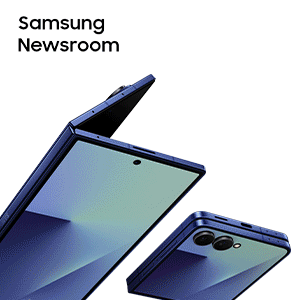김상수 변호사
A 씨는 7년 동안 미국에 머문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했지만,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이탈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단순한 서류상의 주소가 아니라, 실제 생활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 씨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생활한 만큼, 국적 이탈 당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무부의 ‘주소 요건 미비’에 따른 국적 이탈 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사례는 법무부가 국적 이탈 신고를 허가하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복수국적자, 특히 주한미군 자녀처럼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경직성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형식적 주소 기준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시대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주한미군 자녀들은 미군기지 내에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미군 행정체계에 따라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적으로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근거는 미국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변호사가 2023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주한미군 자녀 국적 이탈 사건 판결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대법원은 “미군기지 내에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부친의 근무가 일시적 파견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생활근거는 미국에 있다”며 법무부의 국적 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국적 이탈 제도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해석을 완화하고, 현실적 생활환경을 고려한 ‘실질 중심의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 거주 사실을 이유로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한미군 자녀 등 복수국적자 가족들이 불필요한 행정 분쟁을 겪는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다.
김상수 변호사는 “국적 이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국가의 공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생활근거를 중심으로 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준비할 때는 형식적 주소보다 실제 생활근거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해외 학교 재학증명서 △의료보험 가입내역 △세금신고 내역 △미군기지 내 생활 증빙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복수국적자 증가와 글로벌 인구 이동의 확산에 따라, 국적 제도 역시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