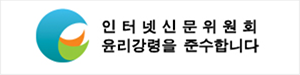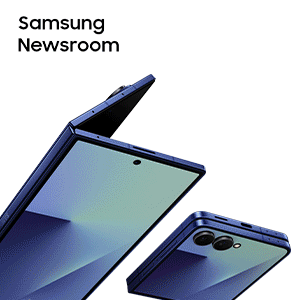김성일 이음연구소장 / 경영학 박사.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투자 대상 확대다. 기금형 제도를 통해 벤처, 부동산, 사모펀드 등 다양한 대체투자를 허용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이 주장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았던 이유가 바로 '지나치게 경직된 투자 규제' 때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현행 퇴직연금, 특히 DC형과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투자 가능 상품 열거방식 등 수많은 족쇄에 묶여 있다. 손발을 묶어놓고 왜 못 달리느냐고 하는 격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운 판을 짜고 투자 대상을 풀어주면 잘 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진다. 왜 새로운 판을 짜기 전에 현재 판의 족쇄부터 풀지 않는가?
퇴직연금 개혁의 단골 논거는 '국민연금'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운동선수와 일반인의 체력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다.
또한 1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막강한 협상력을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직접 투자 기회를 발굴한다. 개인이나 기업 단위로 쪼개진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진열해 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고작이다.
수십조원 규모의 기금을 여러 개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현재 제도에서 규제만 풀어주는 간단한 조치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굳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수술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
올바른 개혁의 순서는 이렇다. 먼저 현행 DC형 및 IRP 제도의 불필요한 투자 한도와 자산군 제한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포트폴리오에 자동 투자되는 '디폴트옵션'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수익률 개선에 뛰어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을 최소 3~5년간 시행하며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그럼에도 구조적 한계가 명백하다면 그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금형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