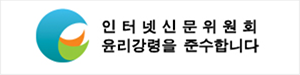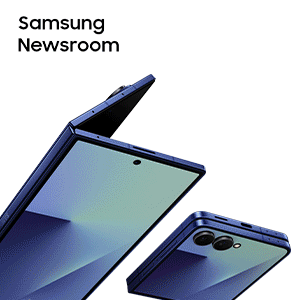한국재무관리학회는 ‘사모펀드 경영의 사례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무권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이정환 한양대 교수. 왼쪽 아래 강원 세종대 교수.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정무권)는 지난 21일 국민대학교에서 2025 정기학술연구 발표회 및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사모펀드 경영의 사례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8개 학술분과에서 총 30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사모펀드 이슈에 대한 학술적 진단과 해법이 집중 조명됐다.
정무권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재무금융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경영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학술적 발전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심포지엄에서 '한국 M&A 시장과 사모펀드' 발표를 맡은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사모펀드의 핵심 M&A 전략과 최근 동향을 분석하며 경제 안보 차원의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고려아연-MBK파트너스 사태와 같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체제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 미국의 상황을 참고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미국은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후 일정 기간 배당 및 자산 매각을 제한하여 단기적인 자금 회수를 막고 있으며, 투명성 강화 및 ESG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재 한경국립대 교수는 MBK파트너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사모펀드 업계에서 MBK파트너스의 실패 사례가 두드러지는데, 인수 대상 기업 선정 역량 부족과 경영 능력의 부재라는 측면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이처럼 밸류업에 실패한다면 사모펀드 자체의 역할과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혁선 KAIST 교수는 사모펀드의 수익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매각 후 재임차, 배당 재자본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산을 유출하고 부채를 전가하는 메커니즘을 비판하며 "사모펀드가 소유권은 행사하되 파산이나 고용 불안과 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비대칭적 구조는 분명 제도적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MBK의 홈플러스 사례와 정확히 부합한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노상윤 전북대 교수는 시장 전반의 역량 강화와 예방적 접근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등 출자자(LP)들이 운용사(GP)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내 사모펀드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시장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이전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사모펀드가 단기적 가치 추출이 아닌 가치 창출에 기여하여,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략적 운영 역량 강화, 투명성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사모펀드가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